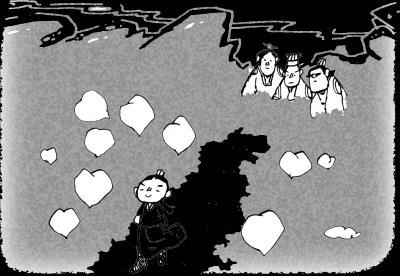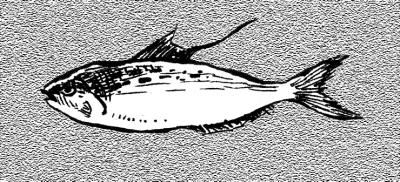넘겨 보는 설화 피아골 종녀촌의 슬픈 사연
2024년 12월 2일 한국설화연구소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지리산 피아골 깊은 골짜기. 도무지 사람이 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마을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마을과 다를 바 없는데 여인들만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미욱 언니! 나랑 빨래하러 가지 않을래?” 얼핏 보기에도 어려보이는 여자 아이 하나가 이야기하자 미욱이라 불린 여자 아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답하였다. “아냐, 소연아. 오늘은 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그럼 나 혼자 다녀올게.” 여자 아이가 빨래바구니를 들고 혼자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오며 소리쳤다. “소연아! 혼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