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겨 보는 설화 천 년을 기다린 명당
고려초, 지금의 고흥 도덕면 한적마을에 박씨 성을 가진 가난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박씨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느라 입이 마를 정도였다.
박씨는 매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지만, 파도가 세게 치거나 안개가 짙은 날이면 마을 뒤에 있는 중뫼산에 올라 밭을 일구었다. 밭이라도 몇 마지기 일구어야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난한 박씨의 밭은 어디를 파도 온통 자갈밭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박씨에게 뭐 하러 그런 돌밭을 일구려 하느냐고 타박을 하였다. 그러나 항상 낙천적인 박씨는 ‘그래도 돌을 하나씩 고르다보면 언젠가는 옥토가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밭을 일구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파도가 높아서 중뫼산에 올라 돌을 고르고 있는데 스님 한분이 지나갔다. 먹고살기도 힘든 바닷가 가난한 어촌까지 스님이 탁발하러 왔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동네인지라 자기 먹을 것도 없는 판국에 남을 신경 쓰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씨가 스님을 불러 세웠다.
“스님, 이런 촌구석에는 어쩐 일이신가요?”
박씨가 아는 체를 하자 스님이 다가왔다.
“벽촌이라 해도 다 사람 사는 동네인데 소승이 못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님이 다가오자 박씨가 망태기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냈다. 그러더니 스님께 먹을 것을 내드렸다. 단사표음(簞食瓢飮 밥 한 덩어리와 물 한 모금)이었지만 스님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양식이었다. 스님이 보기에도 박씨는 자기가 일하다가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분명하였다. 참으로 선한 인상이었지만 가난에 찌든 박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스님이 물었다.
“내 시장하던 차에 요기를 하였으니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리다. 바라는 게 있소이까?”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별 탈 없이 이러구러 살아가는 게지요.”
소탈한 박씨의 모습을 빙그레 웃으며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물었다.
“시주께서 그토록 착하고 소탈하시니 내 명당을 하나 알려드리겠소이다. 저기 산 중턱에 저기 보이시지요?”
근처를 둘러보던 스님이 박씨에게 산 중턱 어딘가를 가리켰다. 박씨가 스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스님이 이어 말하였다.
“저곳은 시주께서 현세의 부를 누릴 명당입니다. 다만...”
“다만 뭐가 문제인가요?”
“다만 훗날 자손들이 부를 누리지 못할 곳입니다.”
당장은 부를 누리지만 후손들이 부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에 박씨의 표정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그런 박씨를 바라보던 스님이 다시 어딘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반면, 산 아래 저기 보이시지요? 저곳은 당장은 몰라도 천 년 후에 후손들이 커다란 부를 누릴 곳이오. 시주께서는 어느 곳을 택하겠소이까?”
갑작스런 스님의 질문에 한참을 고민하던 어부가 산 아래 명당을 택하였다.
“내가 잘 살자고 후손들의 앞길을 막으면 되겠습니까?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을 택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박씨는 중뫼산 아래 명당을 눈여겨보았다. 그러다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자 스님이 알려준 중뫼산 아래 명당에 모셨다. 당장은 부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였기에 사실 박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할 따름이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박씨가 세상을 떠나게 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신 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란다. 다만 당장은 부를 누리지 못하지만 천 년 후에는 후손들이 커다란 부를 누릴 곳이니 대대로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해라.”
변변한 재산 하나 남기지 않으시면서 대대로 묘를 관리하라고 하니 속이 상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라 자식들 역시 대대로 이 사실을 유언으로 남겼다. 박씨의 후손들은 비록 궁핍하였지만 언젠가 후손들이 잘 살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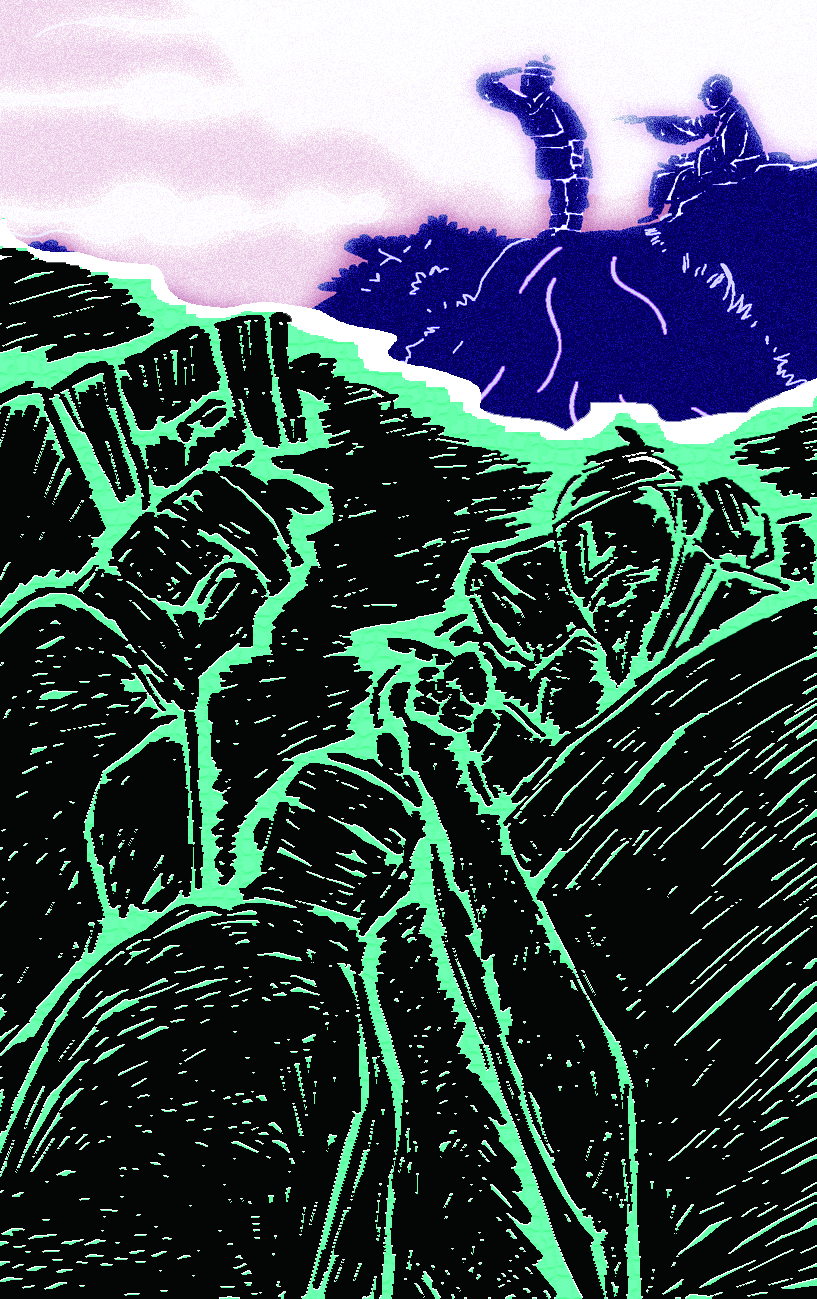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알 수도 없을 때 어부의 후손들은 먹고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전해오고, 손자의 손자, 또 그 손자의 손자에게로 전해졌지만 이제는 한낱 옛이야기로 치부될 뿐 명당은 잊혀지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한적마을에 김씨 성을 가진 가난한 농부가 살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농부는 자기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 남의 일을 다니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느 날, 흰 수염이 성성한 스님 한분이 한적에서 동천을 넘다가 원갯재에서 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농부가 원갯재를 넘어가다 스님을 보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도 연로하신데다 기진맥진한 모습이 처량해보였는지 농부가 지나가다 말고 스님께 다가갔다.
“스님, 어찌 이런 곳에 홀로 계십니까?”
김씨가 말을 걸자 스님이 앉은 채로 올려다보더니 말하였다.
“사람 사는 동네에 어딘들 못가겠습니까?”
그런 스님이 딱해 보였는지 김씨가 스님께 먹을 것을 내드렸다. 밥 한 덩어리와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기력을 회복하였는지 스님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러더니 앉은 채로 건너편 중뫼산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말투만으로 보아서는 꼭 김씨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치 않았다.
“저기 중뫼산 아래에 천석꾼 명당자리가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천석꾼 명당자리라니요.”
명당이라는 말에 솔깃하였는지 김씨가 스님에게 바짝 다가가며 물었다.
“저기 저 명당이 천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발복을 할 것이오. 지금이라도 저 곳에 묘를 쓰면 몇 대 가지 않아 큰 부자가 날 것이오.”
스님의 말을 들은 김씨가 중뫼산 아래 명당이라는 곳에 가보니 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었다. 800년 전에 쓴 묘가 제대로 관리되었을 리 만무하였다. 수소문을 하여보니 근처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의 조상 묘가 있었다는 것이다. 박씨를 만난 김씨가 대뜸 그 땅을 사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제 부모님 묘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마침 맞춤한 땅이 있다 하여 이렇게 왔습니다.”
관심조차 없는 그 땅을 산다 하니 마침 생활이 궁핍하였던지라 박씨가 관심을 보였다. 거저라도 줄 판인데 땅을 산다니 이게 웬 떡인가 싶었다. 하지만 세상 물정이라는 것이, 산다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냥이라도 줄 생각이었다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법이다.
“흠, 아무리 오래 되었다 해도 그래도 조상 묘가 있는 곳인데 팔기가...”
그 동안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조상 운운하는 것을 보니 값을 올려 받을 생각이 분명하였다. 결국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보리 다섯 말을 주고 묘 자리를 산 농부는 부모님 묘를 이장하여 그 자리에 모셨다.

대규모 간척지가 조성된 고흥만 방조제.
또 다시 세월이 흘러 1970년대의 일이다. 고흥만에 대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그 일대가 농경지로 변하였다. 김씨의 후손들이 간척사업을 하여 커다란 부를 누리게 된 것이다. 고려 초부터 천 년을 기다린 명당이 드디어 천 년 만에 발복을 하게 된 것이다 ♠

고흥군 도덕면 한적마을 인근 간척지 항공사진.
©설화와 인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