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인물 보성의 애국지사 홍암 나철 선생
홍암(弘巖) 나철(羅喆) 선생은 1863년(철종 14년) 벌교읍 칠동리 금곡마을에서 아버지 나용집(羅龍集)과 어머니 송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선생의 어린 시절 이름은 두영(斗永)이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선생은 다섯 살 때부터 근처에 있는 서당에 다녔다. 그런데 서당에 들어간 지 한 달도 못되어 서당 훈장이 아버지를 불렀다.
보성군 벌교읍 칠동리에 있는 홍암 나철 선생 생가. 집 앞에 연못이 만들어져 있다.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줄 알고 잔뜩 긴장해 있는 아버지에게 서당 훈장 선생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두영이 아버님, 두영이는 제가 여태 본 아이들 가운데 가장 명석한 아이입니다. 가히 신동이라 부를 만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훈장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을 하자 두영이 아버지가 자세를 고쳐잡으며 다가앉았다.
“구례에 있는 왕 선생께 한 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몰락한 양반 가문인지라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편이어서 두영이 아버지는 고민을 하였다. 두영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자 훈장 선생님이 말을 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왕 선생이라면 두영이 같은 인재를 흔쾌히 받아줄 것입니다.”
천사(川社) 왕석보(王錫輔 1816~1868).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의 스승으로 유명한 그는 구례에서 태어난 조선 말기의 대 유학자이다.
훈장의 추천으로 구례로 간 두영은 왕석보 선생 밑에서 몇 달 동안 사사하였다. 왕석보 선생 역시 어린 두영을 보고는 천하의 인재가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왕석보 선생께 글을 배우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열두어 살 쯤 되어 보이는 형이 두영에게 말을 걸었다.
“꼬마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벌교에서 왔어요.”
“그래? 나는 광양에서 왔는데,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니?”
“다섯 살인데요?”
“다섯 살? 참으로 신통하구나.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게 견딜 만하니?”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니 참아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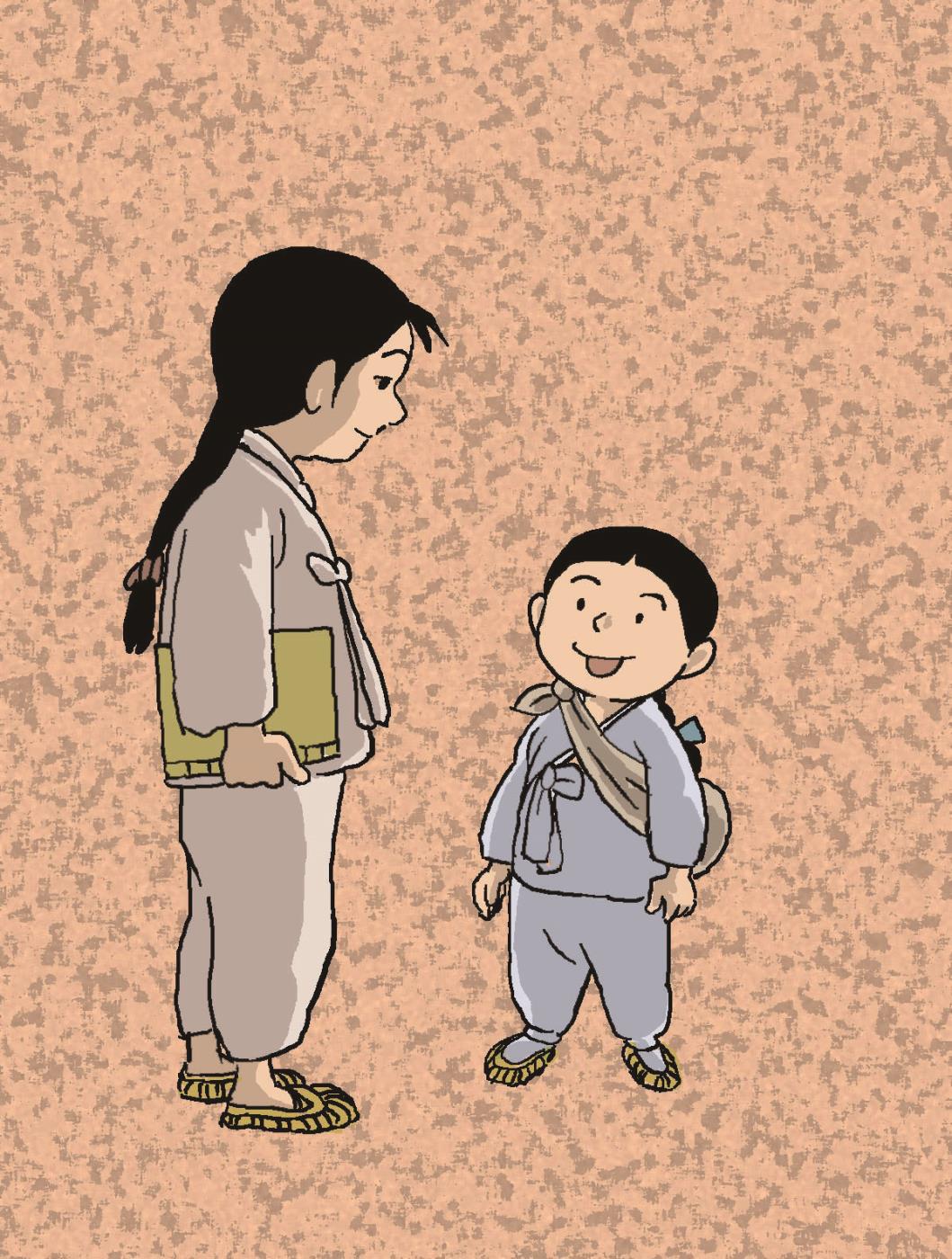
매천 황현. 매천 역시 왕석보 문하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다. 매천의 눈에도 어린 두영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 매천을 가장 아끼는 스승님도 요즘은 어린 막내에게 눈길이 가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듬 해 왕석보 선생이 갑자기 돌아가시자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1869년, 선생의 나이 일곱 살 때의 일이다. 하루는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오는데 불에 탄 저고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고리가 그게 무슨 꼴이니?”
어머니께서 꾸짖으시며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선생이 말하였다.
“동무들과 불놀이하고 놀다가 길수 옷이 탔어요. 길수가 집에서 쫓겨난다고 엉엉 울기에 가엾어서 제 저고리를 벗어주고 대신 길수 저고리를 입고 왔어요.”
비록 자신도 가난했지만 더 어려운 친구를 위해 자신의 저고리를 양보할 정도로 선생은 마음이 넓었다.
또 하루는 친구들과 노는데 뱀이 나타났다. 그러자 친구들이 돌을 던지며 뱀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자 선생이 나서서 말렸다.
“뱀도 무고한 생명인데 함부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아.”
그러더니 나무막대기를 주워서 뱀을 풀숲으로 보내는 것이 아닌가. 선생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남을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다들 선생이 소년등과하리라 여겼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선생은 주경야독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세월이 훌쩍 지나 벌써 20대 후반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선생은 29세 때인 1892년 과거에 응시하여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정7품인 승정원 가주서(假注書)와 승문원 권지부정자(權知副正字)를 역임하였다. 과거 시험을 보기 전 선생은 이름은 인영(寅永)으로 바꾸었다.
33세 때인 1896년 징세서장(徵稅署長)의 발령을 받았는데, 일본의 침략이 심해지자 관직을 사임하고 재야에서 활동하다가 호남 출신의 지사(志士)들을 모아 1904년 유신회(維新會)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여 구국운동을 하였다.
을사조약 체결 직전인 1905년 6월 오기호, 이기, 홍필주 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정객들과 교류하면서 탄원을 하였다.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한·일·청 삼국은 상호 친선동맹을 맺고 한국에 대해서는 선린의 교의로써 부조(扶助)하라.”
나철 선생 등이 일본의 정객들에게 보낸 의견서의 요지이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일본의 궁성 앞에서 3일간 단식투쟁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각 신문에 발표되었다. 다시 네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선생이 말했다.
“이렇게 일본에서 하소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소. 나라 안에 있는 매국노들을 모두 제거해야 국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의견이 제각각이었다. 결국 나철 선생 혼자 단도 두 자루를 사서 품에 넣고 귀국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여 기회를 보고자 숙소를 정하여 지내던 중 하루는 외출했다 숙소로 돌아오는데 웬 노인이 선생을 불러 세웠다.
“그대가 홍암이오?”
대뜸 자신을 알아보는 노인을 잠시 경계하고 있는데 노인이 선생의 손을 잡아끌고 한쪽으로 갔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책을 두 권 꺼내어 선생에게 건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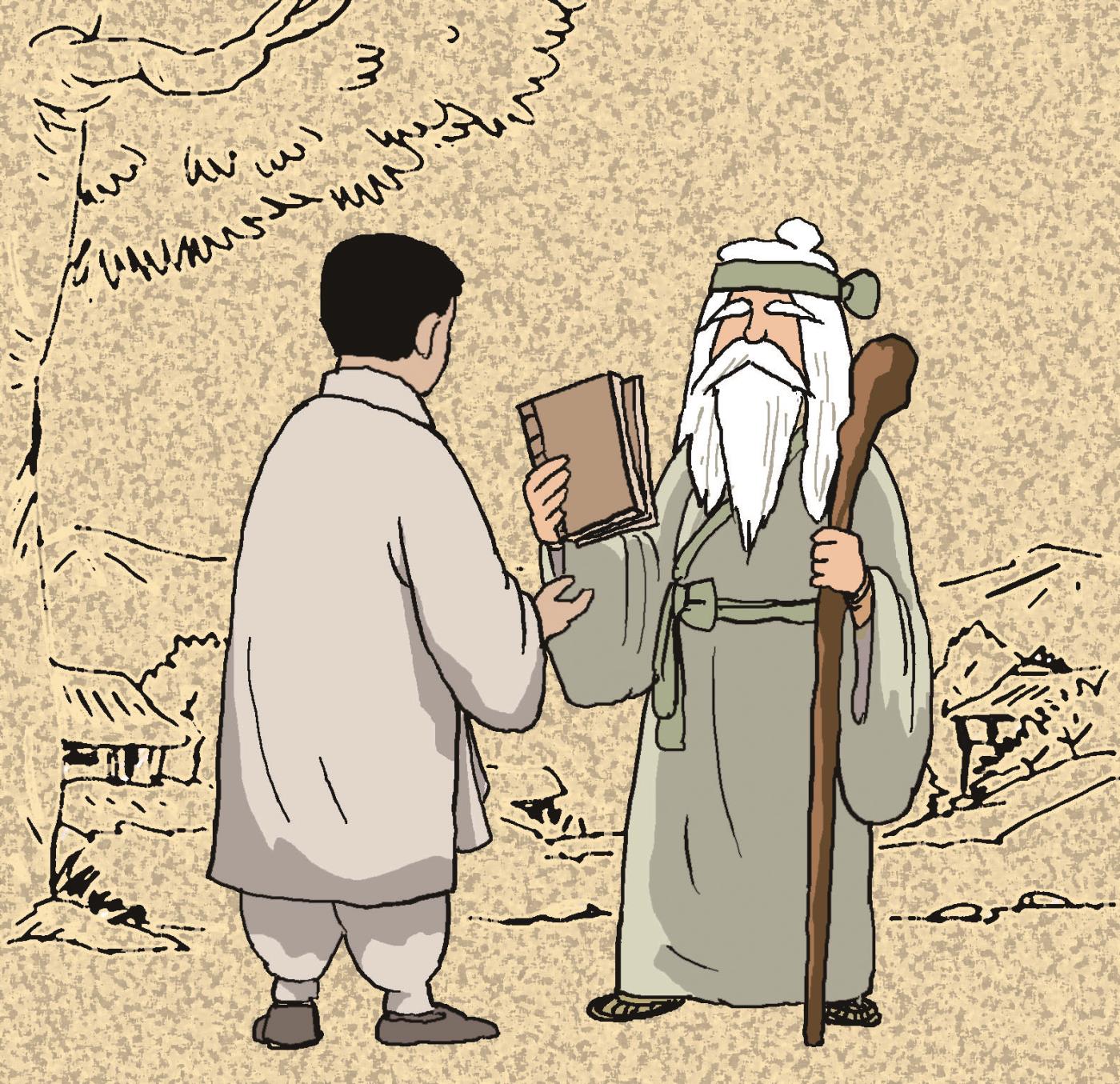
“내 이 책을 선생께 전하고자 기다리고 있었소.”
우연히 만난 백전(伯佺)이라는 노인이 선생에게 건네준 두 권의 책이 바로 ‘삼일신고(三一神誥)’와 ‘신사기(神事紀)’였다. 며칠 동안 두문불출하고 두 권의 책을 독파한 선생은 단군으로부터 기원한 한민족에 대해 깨우치게 된다.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된 선생은 다시 한 번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1906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하여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대립관계에 있던 오카모토, 도야마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역시 별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자 선생은 잠시나마 평화적인 방법으로 선회하였던 자신을 반성하고 귀국길에 폭탄이 장치된 선물상자를 구입하였다. 선생은 귀국 직후인 1907년 1월부터 동지들을 규합하여 을사오적 암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 드디어 3월 25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오적의 주살을 시도하였지만 서창보 등이 붙잡히는 바람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말았다. 동지들의 고문을 덜어 주기 위해 선생은 오기호, 최인식 등과 함께 자수하여 10년의 유배형을 받고 무안군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다.
고종의 특사로 그 해에 풀려나서 1908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외교적인 통로에 의한 구국운동을 계속하였다.
일본에 체류할 때 어떤 노인이 선생을 찾아왔다.
“그대가 홍암이오?”
일본에서는 이미 요시찰 대상으로 찍혀 있었기에 경계를 하였는데, 그러기에는 노인의 나이가 너무 많아보였다.
“저를 어찌 아십니까?”
경계를 풀자 노인이 말하였다.
“백전을 만난 적이 있지요?”
아니, 어찌 이 노인이 백전 어르신을 안단 말인가. 그것도 서울에서 백전을 만난 사실을 일본에 있는 노인이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인가. 선생이 머뭇거리자 노인이 계속 말을 하였다.
“이미 ‘삼일신고(三一神誥)’와 ‘신사기(神事紀)’는 읽어 보았을 터, 내 오늘 그대에게 중대한 임무를 주려고 하오.”
“아니, 임무라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일백(杜一白). 노인의 이름은 두일백이었다. 그는 그날 밤 내내 선생에게 단군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개별적으로 일제에 대항하는 것도 좋지만 비밀리에 전해오는 단군교를 포교하는 것이 더 급하다는 가르침이었다.
일본에 간 일은 별 소득이 없었지만 단군교에 대해 알게 된 선생은 귀국하자마자 동지들과 함께 서울 재동에서 단군신위를 모시고 제천의식을 거행한 뒤 단군교를 공표하였다. 1910년 8월에는 단군교의 이름을 빙자한 친일분자들의 행각으로 인해, 원래의 명칭으로 환원한다는 의미와 함께 대종교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이때 선생은 이름을 철(喆)로 개명한다.
대종교에는 식자층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그래서 서민층 중심인 동학이나 증산교에 비하여 대종교를 양반종교라고도 한다. 한일합방 후 만주로 건너간 독립투사들 상당수가 대종교와 관련된 인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다.
대종교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자 당황한 일제는 1915년 종교통제안을 공포하고 대종교를 불법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교단이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자 1916년 음력 8월 14일, 시봉자 6명을 대동하고 구월산 삼성사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하였다.
그리고는 사당 앞 언덕에 올라 북으로는 백두산, 남으로는 선조의 묘소를 향해 참배한 뒤 “오늘 3시부터 3일 동안 단식 수도하니 누구라도 문을 열지 말라.”고 문 앞에 써붙인 뒤 수도에 들어갔다.

생가에 모셔져 있는 홍암 나철 선생의 생전 사진.
그러나 16일 새벽 이상스럽게 인기척이 없어 제자들이 문을 뜯고 들어가니, 그는 자신이 죽음을 택한 이유를 밝힌 유서를 남기고 폐기법(閉氣法, 극도의 명상상태에서 스스로 호흡을 멈춤)으로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이제 온 천하의 형제자매와 동포가 참혹한 지경으로 빠져들거니와, 내가 괴로움에 떨어지는 이들의 죄를 대신 받을지라. 이에 한 오리의 목숨을 끊음은 천하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선생이 유서로 남긴 내용이다.
당시 선생을 모셨던 시봉자 6인 가운데 한 명이 북한 초대 국가원수를 지낸 김두봉(金枓奉 1889~1961)이다. 주시경 선생의 수제자로 유명한 김두봉은 1916년 ‘조선말본’을 발행한 후 나철 선생을 모시고 구월산으로 들어갔다.

1916년 8월 15일 나철 선생과 시봉자 6인. (앞줄 왼쪽에서 첫 번째가 김두봉, 두 번째가 나철 선생)
선생의 유언에 의하여 백두산 인근에 있는 중국 화룡시 청파호에 유해를 안장하였으며, 1962년에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나철 선생은 죽기 직전 한 수의 시를 남겼는데, 이 시는 광복 전후의 역사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鳥鷄七七 日落東天 조계칠칠 일락동천
黑狼紅猿 分邦南北 흑랑홍원 분방남북
狼道猿敎 滅土破國 낭도원교 멸토파국
赤靑兩陽 焚蕩世界 적청양양 분탕세계
天山白陽 旭日昇天 천산백양 욱일승천
食飮赤靑 弘益理化 식음적청 홍익이화
을유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고
소련과 미국이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하도다.
공산주의와 외래종교가 민족과 국가를 망치고
공산·자유의 극한 대립이 세계를 파멸할지나
마침내 백두산의 선도가 하늘 높이 떠올라
공산·자유의 대립 파멸을 막고 지상천국을 건설 하리라 ♠

대종교 3종사 묘. 중국 화룡시에 있다. 왼쪽부터 서일, 나철, 김교헌.
©설화와 인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